〈생츄어리〉리뷰: 책임의 경계를 탐구하다
* 관객기자단 [인디즈] 김민지 님의 글입니다.
국내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생츄어리가 단 하나도 없다. 탄식과도 같은 이 자막을 끝으로〈생츄어리〉는 특별한 내레이션이나 자막을 내보이지 않는다. 대신 영화가 선택한 것은 이미지의 나열이다. 다음 장면은 뛰어다니는 고라니를 잡으려는 사람들인데, 그물에 잡혀 옴짝달싹 못 하게 된 고라니들은 예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몸부림친다. 그 강렬한 소리와 뒤에 이어지는 고라니의 사체들은 야생동물과의 공존이 불가한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한 문제를 제기한다. 영화는 동물과 인간을, 청주동물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사람들을 특별한 기준점 없이 교차하며 보여준다.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푸티지들에서 관객이 특정한 주장을 건져내기란 어렵다. 설명적이지 않아서 더욱 그렇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어디에 서야 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에 담겨 으스러지는 고라니의 사체와 냉동창고에 쌓인 동물의 사체들, 날개가 찢겨 피가 흐르는 새와 안락사를 맞이하며 흐리게 꺼져가는 반순이의 눈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얼굴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츄어리’는 책임지는 공간이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들에 대해서. 다치거나 장애를 얻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순치되어 야생 생태계에 적응할 수 없는 동물들을 수용할 곳이 필요하다. 최태규 수의사는 정부 정책 때문에 생겨났으나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사육 곰들을 수용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주동물원에 왔다. 그러나 변화는 느리고 당장의 고통은 절박하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김정호 수의사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가끔 자신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만 고민하는 사이에도 무언가는 변하고 그는 희미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흐릿함을 가지고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 방사-유예-안락사 사이에서, 생츄어리가 없는 현 상태에서 이들은 죽음과 생존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들이 수리부엉이를 바라보며 ‘우리도 생츄어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는 영화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안락사는 불필요한 고통을 사전에 제거하는 장치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안락사는 너무 ‘쉬운 선택’이 될까 두려운 타협이다.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잘 따라서, 어디도 받아주지 않아서 이들은 죽어야 할까? 디스크 질환은 사람에게는 너무 흔하고 가벼운 질환이지만 동물에게는 그렇지 않다. 암도, 불치병도 아닌 질환으로 반순이는 안락사 대상이 된다. 동물원은 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보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떤 동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어떤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으니 매 순간이 실험이다. 그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차하는 논의 속 명확한 답은 내려지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드는 수의사의 모습만이 남는다.


그럼에도 희망을 보여주는 지점은 있다. 동물들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동물원. 한쪽 다리가 없음에도 야생으로 돌아가는 고라니. 치료를 받고 다시 날아오르는 새들. 무플론과 친구가 된 고라니와 창틀에 매달려 건강하게 살아가는 새끼 곰 킹과 콩. 더 정교한 주장이 필요할까? 하지만 이미지가 남는다면, 찌푸린 얼굴로 의논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이미지가 남는다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을지 탐구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표 삼아 우리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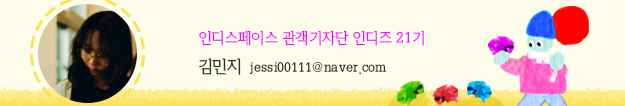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단평] 〈다우렌의 결혼〉: 영화를 위해서라면 (0) | 2024.06.22 |
|---|---|
| [인디즈 Review] 〈양치기〉: 마주보는 얼굴들 (0) | 2024.06.22 |
| [인디즈] 〈다섯 번째 방〉 인디토크 기록: 나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 (0) | 2024.06.18 |
| [인디즈 Review] 〈다섯 번째 방〉: 나로 살아가는 법 (0) | 2024.06.17 |
| [인디즈] 〈미지수〉 인디토크 기록: 위로의 방식, 위로의 방향 (0) | 2024.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