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지는 밤〉 리뷰: 담담하게 마주하는 죽음의 얼굴
*관객기자단 [인디즈] 김진하 님의 글입니다.
밤이면 달이 뜬다. 아니 사실 달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 태양이 멀어지는 밤이면 노랗게 빛났다가 다시 태양 빛이 내리쬐면 잠시간 보이지 않는다. 저녁을 지나 우리 눈에 떠오른 달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다가온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의 그림자처럼, 누군가에게는 미지의 세계처럼,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의 스산한 기운처럼. 영화 〈달이 지는 밤〉은 언제나 떠 있는 달을 새삼스레 인식하듯,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죽음의 흔적을 발견해 보여준다.
두 편의 다른 이야기가 합쳐진 옴니버스 영화 〈달이 지는 밤〉은 전라북도 무주의 빈 집, 굽은 길, 오래된 가게 등 유사한 공간에서 겨울과 여름이라는 다른 시간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차 한 대 없는 새벽의 도로와 농사 도구를 들고 가는 새벽길의 농민, 먼지 쌓인 가게와 사람 냄새나는 시장, 도망치듯 떠난 사람과 어쩌다 돌아온 사람. 세상 어떤 장소도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듯 영화 속 무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김종관 감독이 연출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빈집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푸석한 피부에 피곤한 얼굴로 버스에서 내린 여자는 움츠린 채 길을 걷는다. 앵글의 가장자리에서 오직 걷는 것만이 목적인 듯 빠르게 발걸음을 옮긴다. 걸음이 산에 닿자 이내 엉금엉금 기어가듯 걷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인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그 길을 함께 걷게 된다. 그리고 산의 중턱, 그렇게 다다르고 싶었던 곳에는 바로 딸의 죽음이 있었다. "죽은 건 죽은 거지." 산 자는 치열하게 걸어가서 죽음의 얼굴을 마주한다. 어떤 죽음은 말라버린 가지였다가 고목을 둘러싸고 피어난 꽃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지. 그래도 그 꽃이 참 이쁘다." 죽음은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죽음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장건재 감독이 연출한 2부에서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한다. 걱정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빈자리가 생긴 이후를 준비한다. 그들은 친구이기도 가족이기도 청년이기도 노인이기도 하다. 따뜻하고 판타지스러운 분위기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영화 속 현실과 환상의 세계는 모호하게 얽혀 있다.

두 편의 영화는 모두 죽음을 기억하는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동네 곳곳에 묻어 있었을 삶과 죽음의 흔적을 발견해내고 담담하게 보여줄 뿐이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중에 끝나고 재만 남을 현장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은 죽는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의 끝이 어딘지 알고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본다. 죽음의 흔적 이후, 남은 삶은 관객의 몫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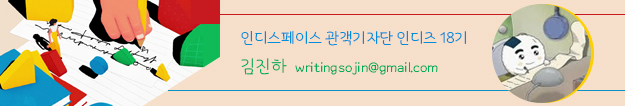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Review] 〈2차 송환〉: 언어로 염원을 오독오독 긷는 행위의 숭고 (0) | 2022.10.11 |
|---|---|
| [인디즈]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인디토크 기록: 붉은 마음의 윤을 마모시키지 못하도록 둥글게 안아 드는 울음 (1) | 2022.10.07 |
| [인디즈 Review] 〈홈리스〉: 양심과 이기심 사이를 줄타기하게 만드는 (0) | 2022.09.27 |
| [인디즈] 인디포럼 월례비행 〈부스럭〉 대담 기록: 작으면서도 큰, 현실에 균열을 내는 ‘부스럭’ (0) | 2022.09.22 |
| [인디즈 Review] 〈성적표의 김민영〉: 나의 삼각형에게 (1)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