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리뷰: 나를 건너 너에게로
* 관객기자단 [인디즈] 김윤정 님의 글입니다.
공간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쩐지 각자의 내면을 닮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간에 필연적으로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에 빗대어 영화의 시작점이 된 사진을 다시 바라본다. 다소 마른 나무들과 대비되게 푸른 잔디들, 거대하고 네모반듯한 비석과 이국적인 건물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경 삼은 두 사람. 서로를 향해 뻗은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역사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까. 카메라를 넘은 그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대신 상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 결정적 순간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레츠 추기경의 회고록 속 문장이 어쩐지 머릿속에 떠오른다.

한인 파독 간호사 1세대, 독일 한인 교회 교인, 레즈비언 커플, 사회단체 활동가, 은퇴한 노동자 등. 수현과 인선이 함께 하며 거쳐온 단어들의 역사이다. 한인 교회 수련회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그들의 진술은 어쩐지 우연을 가장한 만남보다는 발견의 맥락에 가깝다. 수현이 인선에게 반해 길가의 들꽃을 한 아름 엮어 건넸던 꽃다발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현상으로, 훗날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서로를 향한 단초가 된다. 시대와 역사에 이끌려 이주하게 된 디아스포라가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을 넘어 서로를 사랑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것에 이끌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분명한 목적 앞에서 서로라는 공동체를 이끄는 주체가 된다.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I took the on less traveled by,/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고, 그중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한다면, 수현과 인선 두 사람이 내린 선택 이후 그들의 인생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득 과거를 언급하는 푸티지들과 현재를 담은 영상은 자연히 중첩되어 느슨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지나간 과거의 사진과 영상으로 남은 당시의 현재는 삶은 흘러가는 것이라 똑같은 장면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인생은 단 한 번 뿐인 선택과 그에 따른 영원한 결과의 집합이다. “한번 사는 인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던 수현의 말은 그와 인선이 거쳐온 선택이 가져온 모든 것이자, 역사를 압축한 고유한 인상으로 남는다.

1948년에 태어난 수현과 1950년에 태어난 인선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서로라는 기점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시간을 달려 노년의 삶에 접어드는 중이다. 앙리 브레송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 짧고, 덧없고, 위협받는다. 관계가 주는 호혜성은 순수한 기쁨뿐인 줄만 알았던 과거와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그로 인한 슬픔과 고독, 어쩌면 절망 따위를 나누어 감당하는 날들 속에도 삶을 계속 일구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는 서늘한 계절이다.
살에 닿는 때로는 차가운 감촉에도 불구하고 수현과 인선은 멈추지 않는다.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퀴어 퍼레이드에서 행진을 함께하고, 소수자들을 위해 호스피스를 설립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따금 서로에게 손을 얹고 블루스를 출 때도 있다. 테이블에 빙 둘러앉아 콩나물밥을 지어 먹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숟가락 위에 얹어 나누어 먹는 날도 있다. 어쩌면 사랑은 나를 비롯해 타인을 돌보는 과정의 무한한 반복이자,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지어다가 며칠에 걸쳐 나누어 먹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픈데 약 발라주고, 등허리에 로션 발라주고, 그게 섹스지.” 특수성을 거쳐 보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현과 인선, 너와 나는 우리라는 공통의 언어로 남는다. 삶은 영화를 닮아 사건은 다소 함축적이고 어떤 감정들은 추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 모호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언어를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그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지에 대해선 어쩐지 선명하게 남는 듯한 기분이다.

'Community > 관객기자단 [인디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디즈 Review] 〈정돌이〉: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 (0) | 2025.02.24 |
|---|---|
| [인디즈 단평] 〈두 사람〉: 함께 춤추고 돌보는 사랑 (0) | 2025.02.24 |
| [인디즈 Review] 〈은빛살구〉: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0) | 2025.02.17 |
| [인디즈] 〈두 사람〉 인디토크 기록: 사랑과 돌봄 (0) | 2025.02.17 |
| [인디즈 Review] 〈부모 바보〉: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 (0) | 2025.02.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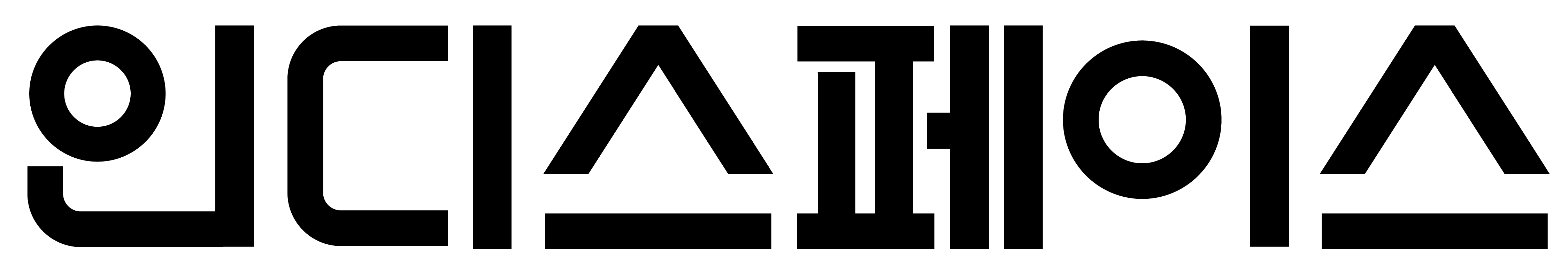




댓글